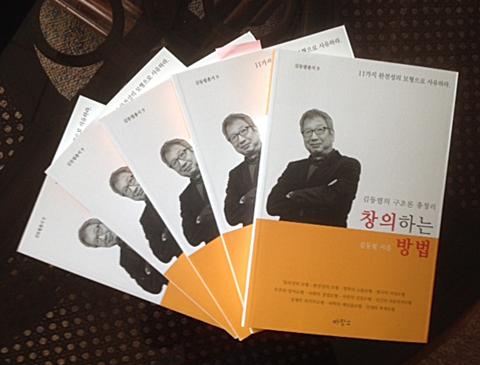구조론의 어려움
오자서열전에 오가 초와 월을 치며 손무의 병법을 쓰는 장면이 나온다. 작가의 상상인지 기록인지는 모르겠다. 병법이라는게 초딩수준의 간단한 거다. 오왕 부차가 월왕 구천과 수전으로 붙었을 때다.
오나라의 진은 가운데을 얇게 하고 양쪽을 두터이 한 것이다. 월왕은 높은 곳에서 오군의 포진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적진 가운데가 비었네. 종심을 뚫어 적을 양단한 후에 각개격파로 가자.
종심을 뚫은 후 각개격파 하는건 나폴레옹의 방법이다. 월군이 돌격하자 가운데의 오군이 슬금슬금 후퇴하고 양쪽 머리와 꼬리가 압박한다. 어느 새 월군은 포위되었다. 어? 이거 한니발의 수법이잖아.
무엇인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술은 대동소이하다는 말이다. 오왕 부차는 손자병법으로 쉽게 이겼다. 그런데 그게 별 대단한 방법은 아니다. 간단한 트릭이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왜 다른 나라들은 병법을 쓰지 않았을까? 병법을 쓰려면 고도의 훈련을 해야 한다. 훈련을 하면 직업군인이 되고 이들의 신분이 높아지면서 귀족들의 지위가 깎이고 나라의 근심덩어리가 된다.
계속 정복을 하든가 아니면 군대를 흩어버리든가다. 여기에 커다란 심리적 장벽이 있다. 춘추전국 시대에 많은 혼란이 일어난 이유는 대개 군주들이 정복사업을 펼치다가 내부분열로 멈추기 때문이다.
왜 합려와 부차는 오자서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오자병법도 마찬가지다. 천하무적이다.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왜 군웅들은 한때 잘 나가다가 멈추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나머지 모든 국가들이 동맹해서 집단으로 대항하기 때문이다. 둘은 왕을 옹위할 귀족들의 지위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에 그 폭주하던 군대의 칼끝이 왕 자신을 향하게 될지도 모른다.
제왕들은 패자의 지위로 만족하고 적당한 선에서 정복을 멈춘다. 전쟁을 계속하면 직업군인이 생기고, 직업군인은 왕보다 지휘관을 따르며, 귀족은 약화되고 봉건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로 치닫게 된다.
그렇다면 진시황은 왜 멈추지 않았는가? 진시황은 애초에 봉건시스템을 박살낼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진시황의 판단은 옳았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진나라도 결국 망했으니까.
무엇인가? 최고의 병법은 있으며, 언제나 이길 수 있지만 그게 시스템을 건드리므로 내부붕괴를 일으키기에 끝까지 못 간다. 진시황은 여불위의 아들이라는 소문 때문에 이미 내부적으로 망가져 있었다.
천하를 정복하여 자신이 신의 아들임을 입증해야 출신성분의 문제를 누를 수 있다. 큰 야심은 큰 고난에서 나오는 법이다. 커다란 심리적 장벽이 있다. 구조론도 마찬가지로 깨달음이란 장벽이 있다.
구조론은 쉽다. 바둑과 같다. 9급끼리 두면 쉽고 9단끼리 두면 어렵다. 구조론이 어려우면 쉬운 구조론을 하면 된다. 9급이 9단을 이기려 하면 곤란하다. 구조론에 발끝만 살짝 담궈도 이익을 얻는다.
모르면 공식을 외우면 된다. 수학이 어려워도 산수는 쉽다. 산수가 쉬워도 구구셈은 외어야 한다. 거기에 장벽이 있으며 그 장벽을 넘어야 한다. 구구셈을 떼지 않고 어렵다고 투덜대면 퇴출이 답이다.
◎ 제왕이 병법으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봉건구조의 내부붕괴 때문이다. 시스템을 대체할 대체재가 없으면 끝까지 가지 못한다.
◎ 구조론으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심리적인 내부붕괴 때문이다. 내적인 붕괴를 감수하고 심리적인 대척점을 옮겨야 한다.
구조론이 어려운게 아니라 실은 어려움이라는 놈이 그곳에 서식하고 있다. 똥개도 먹어주는 거리가 있다. 심리적 저항선이 있다. 외부인이 경계에 얼쩡거리면 사납게 짖어댄다. 겁 없는 개만 짖지 않는다.
구조론의 짖는 거리가 있다. 어렵다는둥, 이해가 안 된다는둥 하는 말은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 레파토리가 변함없이 고정되어 있다. 어떤게 어려운게 아니고 항상 어려운 그놈이 뿌리내리고 산다.
일일이 설명해주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다. 페이지를 링크해 놓았다가 어려울 때 제갈량이 준 주머니를 열어보듯이 그 페이지를 펼쳐보면 된다. 어려워 하는 분 치고 내게 정식으로 질문하는 사람은 없다.
바로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거기에 장벽이 있다. 심리적인 내부붕괴가 일어난다. 매우 어렵다. 그 지점은 개장수가 사납게 짖는 개를 손쉽게 제압하듯이 가볍게 돌파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깨달음이다.
정답은 이것이다. 화살은 머리와 꼬리가 있다. 이거 이해못하는 사람은 없다. 머리와 꼬리는 대칭이다. 대칭은 도처에 있다. 전후, 상하, 좌우, 음양, 원근, 고저, 장단, 명암 많기도 하다. 여기까지는 쉽다.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다는게 구조론이다. 대칭을 깨뜨린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가? 이렇게 말하면 바로 반론 들어온다. 근데 당신은 왜 꼬리를 잡고 있냐고. 에휴. 어디를 쥐든 내가 쥐는 곳이 머리다.
모르겠는가? 임금이 어디에 있든 임금이 있는 곳이 궁이다. 궁은 경복궁이 아니냐고? 임금이 궁궐을 떠나 이동하면 그곳이 행궁이다. 왜인가? 그곳에 에너지를 싣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답을 결정한다.
처음에는 머리가 꼬리가 구분되어 상대적이나 에너지가 들어오면 에너지가 결정하므로 절대적이다. 대칭이 비대칭으로 도약한다. 모든 구조론의 어려움은 실상 이거 하나 뿐이다. 에너지 태워 싣기다.
구조론을 모르는 이유는 대상에 에너지를 탑재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를 태운다는 말은 연소시킨다는 말이 아니고 차에 올라탄다는 말이다. 에너지를 구조의 차에 탑승搭乘 시켜야 한다.
구조론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실제로는 이 하나의 질문이다. 그림은 화가의 관점을 태우고 음악은 연주자를 태우고 자동차는 운전자를 태운다. 반드시 무언가를 태운다. 태우면 비대칭으로 도약한다.
세상 모든 것은 전후, 상하, 좌우, 음양, 원근, 고저, 장단, 명암으로 대칭을 이루지만 주인공을 태우고 에너지를 태우는 순간 대칭은 사라진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조론은 어렵다. 불가능이다.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원래 구조론이 안 되고, 깨달음이 안 되는 사람이다. 포기해야 한다. 활은 활몸과 시위의 2지만 궁수가 그 활을 당겨 에너지를 태우는 순간 활은 팽팽해져서 모두 하나가 된다.
활이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에서 에너지로 보면 활몸과 시위의 구분이 없다. 모든 대칭이 소멸하는 지점이 있다. 그러나 보통은 자동차 시동을 꺼놓고, 활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소실점을 찾지 못한다.
소실점은 에너지의 소실점이며 에너지를 제거하는 순간 그것은 죽어버리며 일의성은 사라지고, 완전성도 사라지고, 전후, 상하, 좌우, 음양, 원근, 고저, 장단, 명암으로 나눠진 이분법으로 퇴행한다.
구조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은 어려울 때마다 이 대목을 읽어보시기 바란다. 자신이 슬쩍 스위치를 내려서 전원을 꺼놓고, 자동차의 시동을 꺼놓고, 에너지를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다.
구조론에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자신이 혹시 스위치를 꺼버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보통 말하는 구조, 서구 구조주의 철학의 구조는 에너지를 태우지 않은 죽은 구조다. 구조론은 산 구조다.
구조는 누구나 알지만 그 구조는 에너지가 태워지지 않은 죽은 구조입니다. 구조에 에너지를 태울 때 시스템은 비로소 작동을 시작합니다. 천 가지 다양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창의하고 싶다고요? 다양하게 하면 됩니다. 다양하게 하는 방법은 구조에 에너지를 태우는 것입니다. 죽은 구조를 산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투입하여 사회라는 활의 시위를 팽팽하게 당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사결정은 비로소 가능합니다.팽팽하게 당겨졌지만 설사 틀린 판단을 했어도 오뚝이처럼 복원됩니다. 그 활줄이 느슨하게 풀어졌다면 설사 맞는 판단을 해도 외부의 작은 교란요소에 의해 흐트러져 버립니다. 외부의 교란요소를 탓하지 말고 내부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지 않음을 탓하십시오. 언제나 팽팽한 쪽이 느슨한 쪽을 이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