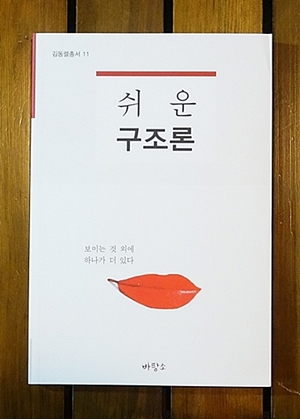**자연선택설의 허구**
과학처럼 보이는 비과학이 많다. 아이디어는 과학적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이야기들이 많다.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에 많고 프로이드나 다윈의 일부 오류들도 마찬가지다. 왜? 방법론의 부재 때문이다. 구조론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
주술사가 푸닥거리로 환자를 고치겠다고 하면 비과학이다. 한의사가 침구술로 고치겠다면 과학인가? 양의사의 기준으로 보면 한의도 비과학이다. 일부 치료효과는 있지만 부분적 효과를 방패막이로 얼버무리면 곤란하다. 엄격해져야 한다.
인과율이 있다. 언제라도 사건의 원인측을 통제해야 한다. 이게 구조론이다. 자연선택 개념은 결과측 사정이지 원인측 사정이 아니다. 말하자면 침구술 비슷한 거다. 결과적으로 치료만 되는 다 되는게 아니고 정확하게 원리를 규명해야 한다.
물론 다른 치료법이 없다면 한의를 따를 수 밖에 없다. 한의는 625때 엄청나게 늘어난 환자를 치료할 의사의 부족 때문에 임시변통한 것이 정치권의 의사결정능력 부재로 결정을 미루다가 계륵이 된 거다. 좋은게 있으면 나쁜걸 버려야 한다.
◎ 자연선택.. 여러 형태의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있었는데, 환경에 적합한 것이 살아남았다.
◎ 구조론의 유전자선택.. 핀치새는 부리모양을 다양하게 변이시키는 유전자가 있는데 각자 자기 환경에 맞는 지역으로 날아갔다.
자연선택설은 인과율과 맞지 않다. 결과를 원인으로 되치기한다. 이는 논리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일어난 해프닝이다. 한 마디로 무식한게 죄다. 공부 좀 하자. 새는 잘 날아간다. 날개가 없어서 못 가는게 아니다. 핀치새가 서식지를 선택했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흑인은 더운지역에서 살아남고 에스키모는 추운 지역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천만에. 흑인은 더운 지역으로 옮겨갔고 에스키모는 추운지역으로 옮겨갔다. 인간은 발이 있어서 어디든 잘 간다. 옮겨가면 그만이다.
백인도 아프리카에 살 수 있다. 모기가 많은 지역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 정글에 간 첫째 날에 모든 옷을 벗고 모기들이 맘껏 물게 한다. 며칠만 그렇게 하면 면역이 생겨 모기에게 물려도 괜찮다. 이런 내용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
옛날 사람들은 모기장 안 치고도 잘만 살았다. 자연선택은 없다. 인간이 적응한다. 유전자의 선택이다.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은게 아니다. 목이 짧은 기린은 풀을 먹으면 된다. 나무가 있는 곳에 어찌 풀이 없겠는가? 풀밭으로 가면 된다.
기린도 물을 마셔야 한다. 그런데 기린은 어떻게 물을 마시지? 앞다리를 벌리면 된다. 물을 마실 수 있는 기린이 풀을 못 먹겠는가? 게다가 아프리카에는 키가 2미터 쯤 되는 롱다리 풀이 많다. 목이 짧은 기린이라도 잘만 살아남는다.
유전자는 외부의 환경에 대응하는 수단을 만들어낸다. 빛을 쪼이면 눈을 만들어내고, 소리를 들으면 귀를 만들어내고, 냄새가 있으면 코를 만들어내는 식이다. 변화된 외부환경의 자극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낸다.
동굴에 사는 장님물고기는 스스로 눈을 퇴화시킨 것이다. 눈이 있는 물고기가 죽고 장님물고기만 살아남은게 아니라 그 물고기는 원래 환경이 동굴임을 감지하면 눈을 퇴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유전자에 이미 그런 기능이 만들어져 있다.
기린의 목이 길어진게 아니라 다리도 함께 길어진 것이다. 밸런스가 있다. 기린의 목이 특별히 길어진 이유는 사바나의 동물들은 정기적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멀리 봐야 하기 때문이다. 사자가 나타나면 시력이 좋은 기린이 먼저 움직인다.
시력이 나쁜 얼룩말은 기린을 보고 있다가 기린이 뛰면 뒤따라간다. 헷갈려서 사자가 있는 쪽으로 도망치면 난감해지기 때문이다. 기린은 사바나의 파수꾼이다. 다들 기린의 눈치를 보고 있다. 왜? 기린은 절대로 잠을 자지 않기 때문이다.
기린은 애초에 24시간 철야로 근무하는 보초병 유전자를 가진 것이다. 코끼리가 없으면 관목이 우거져서 동물의 이동로가 막힌다. 사바나의 동물은 죽는다. 정글에는 많은 동물이 살 수 없다. 정글은 식량이 없어서 녹색사막이라고 불린다.
정글은 씨앗을 퍼뜨릴 넓은 공터가 없고 따라서 식물의 씨앗도 적다. 먹이가 부족하다. 정글을 부숴버려야 동물이 살 수 있다. 코끼리가 앞장서서 길을 내는 탱크 역할이다. 기린은 길을 찾아내는 망루 역할이다. 누와 얼룩말은 길을 다진다.
코끼리와 기린이 앞장서고, 얼룩말과 누가 따르며, 키가 작은 동물은 이들이 가면서 풀을 뜯어먹고 난 자리에 난 새 순을 먹는다. 작은 사슴들은 키가 크고 뻑센 풀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바나는 정기적으로 불타야 동물이 살 수 있다.
동물의 이동순서는 지켜져야 하며 한 번 잘못되면 전멸하는 수가 있다. 키가 작은 동물은 이동로를 찾을 수 없다. 풀이 금방 자라서 2미터를 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앞이 안 보이므로 길잡이 기린과 누떼가 없으면 이동을 못해 전멸한다.
생태적 지위라는 말이 있다. 기린의 목이 특별히 길어진 이유는 기린의 생태적 지위 때문이다. 나방이 100만개의 알을 낳으면 100만마리의 애벌레가 일시에 알에서 깨어나 일제히 잎을 먹어치우는데 가끔 나무의 잎이 바닥나서 나무가 죽는다.
나무가 죽으면 벌레도 죽는다. 과잉번식이다. 생태계는 이를 제어하는 정밀한 장치가 있다. 곧 생태적 지위다. 순서대로 알에서 깨어나게 하는 장치가 있다. 혹은 새들이 벌레의 일부를 먹어치워서 조절하는 정밀한 프로그램이 발달해 있다.
기린의 유전자는 자신이 어떤 생태적 지위를 갖는지 파악하고 그 방향으로 변이해 온 것이다. 식물도 생태적 지위가 있다. 홍수가 나면 황무지가 생기는데 이때 식물이 재빨리 옮겨오지 않으면 사막화가 진행되어 생물이 살 수 없게 된다.
이동속도가 빠른 식물이 제비꽃이나 민들레 등 지표를 광범위하게 장악하고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이다. 이들은 모두 키가 작다. 이들이 꽃을 피우고 난 다음 여름식물이 도착한다. 가을에 열매맺는 풀이 가장 늦게 도착하는데 키가 크다.
이런 현상은 숲에서도 관찰된다. 얼레지 등 일찍 꽃피우는 풀은 나무가 잎을 내기 전에 다 자라야 한다. 그늘이 생기면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톱니바퀴처럼 정밀하게 돌아가는 장치가 있다. 유전자는 이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
키가 작은 조랑말도 있고 키가 큰 말도 있다. 목이 길면 긴대로 살 수 있고 짧으면 짧은 대로 살 수 있다. 각자 자신의 신체구조에 맞는 서식지로 옮겨가서 사는 것이다. 피그미들은 정글이 자신에게 맞다고 보고 그리로 옮겨가서 사는 거다.
자연이 선택하는게 아니라 유전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정글이 피그미를 선택한게 아니라 피그미가 정글을 선택했다. 피그미 외에도 키가 작은 부족민은 많다. 부시맨도 키가 작지만 이들은 사막을 선택했다. 자연선택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자연선택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들이 있지만 이들은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니다. 백곰은 북극에만 사는게 아니고 심심하면 내륙으로도 들어온다. 북극에서만 살 수 있는게 아니다. 동물원에서도 잘만 산다. 흑인은 특별히 땀구멍이 많다고 한다.
개는 땀구멍이 없어도 잘만 산다. 추운 뉴욕에도 많은 흑인들이 있다. 그들이 따뜻한 플로리다로 몰려들고 있지만 흑인이 반드시 거기에만 사는 것은 아니다. 자연선택은 결과를 보고 유추한 것이며 과학의 잣대로 엄격하게 따진 것이 아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조절능력이 다릅니다. 자연선택이나 구조론이나 얼핏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자연에는 조절장치가 없고 유전자에는 있습니다. 조절장치가 있는 쪽, 스위치가 있는 쪽이 사건의 원인측입니다. 밥을 먹었기 때문에 똥을 쌀 수도 있고, 그냥 화장실에 갔기 때문에 똥을 쌀 수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둘 다 맞는거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밥은 똥을 결정해도 똥은 밥을 결정 못합니다. 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선택설이죠. ‘오늘은 똥을 조금만 눌꺼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제 밥을 열그릇 먹었다면? 이때도 오늘은 똥을 조금만 누겠다는 계획이 성공할까요? 천만에. 오늘 많이 먹었을 때 이미 내일 많이 싸기로 다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구조론으로 말하면 질, 입자, 힘, 운동, 량에 걸쳐 5회 조절되는데 질이 중요하고 양은 조금 조절합니다. 자연선택은 극히 미미하게 조절합니다. 무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