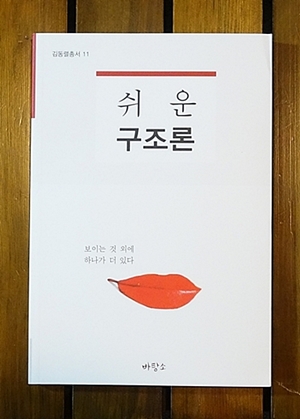** 미학의 역사, 패권의 역사**
사실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베토벤 이전에는 음악이 조잡했다. 돈 많은 귀족 후원자가 원하는 음악을 만들어 바쳤기 때문이다. 베토벤이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만들었다. 악보를 인쇄해서 돈 받고 팔아먹는 방법을 생각해냈기 때문이다.
갑을관계가 바뀌었다. 사실주의 의미는 예술과 권력의 갑을관계에 있다. 영화라면 감독과 관객의 갑을관계다. 관객의 기호에 맞추면 영화가 아니라 똥이다. 문제는 과학을 권력자의 기호에 맞추는 거다. ‘지동설로 갈까요 천동설로 갈까요?’ ‘천동설이 더 그림 나와주지 않나?’ ‘네 천동설로 밀어보겠슴다.’
이런 판국이었다. 조선왕조 시대라면 일식이 예상보다 5분이나 늦었다고 과학자를 처벌하는 판이었다. 실패다. 사실주의는 작가에게 힘을 실어준다.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사실로 가면 결국 그 연결의 구심점이 되는 코어에 가 닿는다. 그것은 진리다. 사실주의가 진리를 갑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동아시아의 사실주의는 공자가 만들었다. 그래서 공자가 위대한 것이다. 반면 도교는 글러먹었다. 유교에 대한 안티가 도교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남 눈치를 보면 실패다.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 도교는 유교의 눈치를 보았다. 묵가도 글러먹었다. 겸애라는 목적이 앞서면 실패다. 묵가는 나중 변질된다.
진시황이 천하를 정복하면 착취자의 숫자가 줄어 민중의 삶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얄팍한 계산 때문이었다. 전쟁을 막는게 묵가의 목적인데 약자를 돕는 것 보다 강자를 돕는게 더 확실하게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다. 유교는 진시황의 독재에 저항해서 살아남았고, 묵가는 독재권력에 편승해 망했다.
목적이 앞서면 안 된다. 자연의 자연스러움을 따라가야 한다. 작가는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려다 망하고 음악가는 후원자를 기쁘게 해주려다 망한다. 양념으로는 센스가 되나 지나치면 본질을 다친다. ‘천지불인’이라는 말이 있다. ‘인’을 앞세우면 곤란하다. 가장 좋은 디자인은 입기에 불편한 디자인이다.
가장 좋은 차는 운전하기에 불편한 차다. 인간을 위한 편리는 나중 생각해야 한다. 선의든 악의든 의도가 앞서면 글렀다. 진리가 먼저다. 공자의 사실주의가 그래서 중요하다. 사마천이 위대한 것은 임금 비위를 맞추는 거짓 역사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시 공자의 가르침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삼국사기도 김유신 항목만 빼면 제법 훌륭하다. 김유신 열전에만 유독 동굴에서 신선을 만나 어쨌다는둥 하는 엉뚱한 내용이 나온다. 이런거 유교에서 용납 안 한다.그래도 소설 비슷한 포맷으로 가는 일본서기와는 격이 다르다. 공자가 예술에 있어서도 사실주의를 주장했다면 더욱 좋았을텐데 말이다.
이발소 그림이 그림이 아닌 이유는 그림값을 내는 주문자의 요구에 맞춘 상품이기 때문이다. 가짜다. 지하철 시가 시가 아닌 이유는 역시 그런 조잡한 의도를 들키기 때문이다. ‘과학에 기반을 둔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관점’이 형성되지 않으면 결국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거짓 시를 쓰게 된다.
언어 안에 결이 있다. 언어의 결을 따라가다 보니 절로 시가 되어야 한다. 지하철 시인은 타인의 동의를 구한다. ‘난 이렇게 느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공감툰 수법이면 이미 틀렸다. 시인은 광부처럼 캐내는 직업이다. 자기광산을 가져야 한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갑이 되어야 진짜 시가 나와준다.
종교가 인간의 앞길을 막는 이유는 인간을 을로 만들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이 역사를 진보하게 한다. 이념이 종교를 대체하는 시대이면 이념개혁이 필요하다. 종교가 처음 도입될 때 문명은 비약했다. 이념이 처음 도입될 때도 마찬가지다. 새것이 낡은것을 밀어내면서 세상과의 갑을관계를 바꾸었다.
그러나 종교와 이념이 고착되면서 인간은 을이 되어버렸다. 새로운 종교와 새로운 이념이 전파될 때 잠시동안 인간이 갑이었다. 부단히 진도 나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영합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준엄한 비판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알려진 흥행공식에 지배되면 망한다. 진리를 등에 업어야 한다.
문학에서 사실주의는 돈 키호테가 시초다. 그 이전은 ‘독자들을 즐겁게 해주겠다’는 의도가 앞선다. 복카치오의 데카메론이 그렇다. 독자들에게 무려 감동을 선사하겠다거나 교훈을 베풀어주겠다고 하면 이미 문학은 사망한 다음이다. 문명은 영국의 공장에서 시작된게 아니라 사실주의에서 시작되었다.
왜 사실주의인가?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짜덩어리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분을 따로 떼서 제멋대로 요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소를 죽이지 않고는 요리할 수 없다. 진리가 갑이어야 한다. 구조론의 궁극적인 논리는 연결과 단절의 논리다. 모두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답이다.
사실주의를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좁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판타지로 가더라도 초반 설정과 맞아야 한다. 중간에 설정을 깨뜨리면 사실주의가 아니다. 데스노트처럼 중간에 뜬금없이 ‘응? 노트에 이런 기능도 있었네.’ 하고 추가하면 안 된다. 결을 만들고 그 결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진짜 사실주의다.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실을 따라가면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이걸 건드리면 저게 어긋나고 하는 식이지요. 무리없이 억지없이 자연스럽게 탐구해 들어가면 결국 근원의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나는 것은 누구도 손대지 않은 독창적인 보편성입니다. 큰 울림이 있습니다.